황미나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80년부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현역작가로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순정만화계(혹은 여성만화계)의 대모”로 불리고 있다. 또한, 1993년 일본의 성인잡지 [모닝]에서 <윤희>로 성공을 거둔 뒤, 두 번째 작품 <李씨네 집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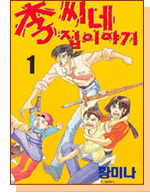 미나의 공식 홈페이지
미나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그는 자신의 작품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1980년~1980년대 중반: <이오니아의 푸른 별>에서 <불새의 늪>까지)는
‘로맨티시즘의 시절’,
제2기(1980년대 중반~1990년까지: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부터 <무영여객>까지)는
‘리얼리즘의 시절’, 그리고 마지막
제3기(1990년~현재까지: <취접냉월>부터)는
‘장르 파괴의 시절’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구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그의 작품경향을 되짚어 보겠다.
그는 1980년 [소녀시대]에서 <이오니아의 푸른 별>로 데뷔했다. 하지만 곧 연재가 중단되었고, 일본만화 <이라카노 나미>를 베껴 <나의 꿈나무>를 출간한다. 이 일에 죄의식을 느끼고 이후로 는 창작에만 전념한다. 특히 <아뉴스데이>, <굿바이 Mr.블랙>, <불새의 늪> 등 장편 서구 시대물에 주력했다. <너의 이름은 Mr.발렌타인>, <애수의 교향시> 등 현대물, 학원물도 다수 그렸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당시 만화출판사들이 현대물의 단행본 출판을 기피했”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의 초기 작품이 서구물, 시대물에 집중된 이유는 일본만화 <올훼스의 창>과 <베르사이유의 장미>가 큰 인기를 끈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황미나가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를 발표한 1985년은 한국 순정만화의 분수령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적인 감정과 정서를 담은 자생적인 순정만화가 태동한 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시도했던 이 작품은 ‘심의’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그 때문일까? 이후의 작품은 <방랑의 광시곡>, <엘 세뇨르> 등 과거로 회귀한 듯한 서양 시대물과, <다섯 개의 검은 봉인>, <녹색의 기사>(이상 판타지), <스턴트 맨 스턴트 걸>, <그랑프리>(이상 액션물) 등 어린이잡지용 만화로 양분된다. 한편, 그는 만화동호회 ‘나인’을 만들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아홉번째 신화]라는 동인지를 3호까지 출판한다.

1989년 주간 [점프] 창간과 더불어 <무영여객>을 발표한다. 그는 <취접냉월>부터를 ‘장르 파괴의 시기’로 분류했지만, 소년지로 활동영역을 넓힌 <무영여객>부터를 ‘순정만화가 황미나’와 결별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순정지, 아동지, 소년지, 성인지, 일본잡지, 카톨릭잡지 등 다양한 지면에, 무협물, SF, 액션물, 가족물, 판타지, 성인물, 종교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따라서 많은 평론가들이 “순정만화의 틀을 깼다”는 점에서 그를 칭찬한다. 하지만, 그것이 플러스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남성독자에게 어필했지만, 많은 여성 팬들이 그의 작품을 외면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을 담고 있지 못하며, 남성만화와 비슷하게 과장된 여체가 볼거리로 제공되며, 남성적인 시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황미나는 한국 순정만화가 거의 전무하던 시기부터 활동하여
순정만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까지 꾸준히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림실력도 탄탄하고 연출력도 뛰어나다. 반면, 그의 작품은 몹시 ‘상투적’이다. 대중성이나 상품성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작가 황미나 고유의 향취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 <李씨네 집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여성 비하적인 시선은 혐오감을 자아낼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