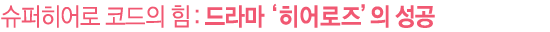
미국의 대중문화판 일반에서 슈퍼히어로라는 만화 특유의 소재가 확실한 히트요인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만화가 끝도 없는 자기복제를 통해서 자체적인 산업적 활력을 완연히 잃어버리고 있던 80년대 초, 슈퍼히어로를 다룬 실사 영상물 가운데 최초로 유치함을 무기로 내세우지 않았던 영화 ‘슈퍼맨’이 히트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워치멘’이나 ‘다크 나이트의 귀환’ 같은 86년에 일련의 천재적인 작품들 덕분에 완전히 재해석되기 시작한 슈퍼히어로 만화의 영향 덕분에 만들어진 어둠 가득한 89년작 영화 ‘배트맨’의 대성공, 그리고 여기에 기댄 엄청난 프랜차이즈 상품의 물결이 먹혀들었기 때문일까. 뭐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심지어 티비 드라마에까지 슈퍼히어로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배트맨의 여성캐릭터들이 주연을 맡았던 ‘버즈 오브 프레이’, 슈퍼맨의 청소년기를 다룬 ‘스몰빌’ 등이 영화에서 성공한 캐릭터들이 드라마로도 성공을 나눠주기 바라는 발상들이다.
 |
| 미국 NBC 드라마 ‘히어로즈’(Heroes) 이미지컷 |
북미지역에서는 현재 NBC에서 방영중인 ‘히어로즈’(Heroes)가 화제다. 아직 첫 번째 시즌의 중반에 불과한데도 실제 실시간 시청자가 1500-2000만 명 사이를 오가는 대형 성공을 기록 중인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90년대 이래로 성공한 슈퍼히어로 관련 실사 영상물들의 장점들의 총합에 만화 특유의 장르규칙을 섞어 넣은 야심찬 프로젝트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자다. 물론 각 주인공들이 초능력을 발견하는 대목이 영화 엑스멘 시리즈 마냥 정신병이나 소수자 개념에 대한 은유로 가득한 것도 미덕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전개나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한층 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사실 기존 대부분의 슈퍼히어로 드라마는 특정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따오거나 단지 초능력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라는 단순한 소재만을 가져올 뿐, 만화로서의 슈퍼히어로 장르를 풍부하게 한 특유의 장르 코드들과는 은근히 거리를 두었다. 다양한 초능력자들의 협업구도와 반목,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기한 능력의 경연과 그러한 능력마저 제압하는 제한 조건들, 문자 그대로의 ‘힘’, 세계멸망 과 절대악 같은 대형 해결 과제, 각각 전개되는 캐릭터들의 일상과 사건이 미묘하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세계관 공유 개념, 무한 연속극과 완결된 에피소드 단위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이야기 전개 등등 지난 70여년 동안 만화가 발달시켜온 특유의 규칙들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 그러나 ‘히어로즈’는 드라마의 전개 방식 자체 부터 완전히 미국의 이슈 단위 만화 연재 포맷 그대로다. 즉 4-5개 화 정도 단위로 하나의 ‘스토리 아크’로 묶이고, 심지어 그것에 대한 별도의 부제까지 붙는다. 즉 연속되지만 다음 ‘챕터’다운 새 이야기가 전개되는 식이다. 나아가 다양한 매체 접근을 통한 몰입도 또한 뛰어나다. 공식 사이트에 가면 매 주 온라인 만화로 각 캐릭터들과 관련된 외전이 한편씩 새로 연재되는데, 각 주에 방영된 내용과 연계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드라마는 만화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Jeph Loeb 같은 만화계의 베테랑이 공동 총제작자이자 각본팀에 참여하고 있고, 그와 오랜 호흡을 맞춘 Tim Sale이 작중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인 만화책 시리즈 ‘9th Wonders와 각종 예지적인 그림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총책임자인 Tim Krring 역시 오랜 만화팬이며, 이미 80년대에 초능력 특공대의 활약을 다룬 ’Mistfits of Science(국내 방영명: ‘슈퍼특공대’)의 각본을 맡은 바 있다. 덕분에 이 드라마는 현재의 평범한 시민들의 섬세한 인간관계 발전과 스릴러 전개와 동시에, 미래에서 올백머리와 가죽잠바에 등에 큰 검을 둘러맨 히어로가 시간여행을 해서 현재에 나타나는 만화책 특유의 폼 나는 영웅상이 위화감 없이 잘 섞여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 드라마의 성공적 시작 덕분에, 아마도 미국 대중문화판에는 더욱 더 만화의 장르코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의 가장 대중적인 정수로 위치하고 있던 만화라는 양식의 진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과장된 포즈나 문자로된 효과음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향해서 말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화의 코드들이 영향력을 키울지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