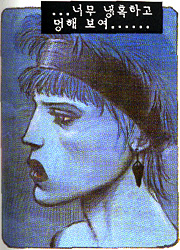

얼마전 잡지에서 앙키 빌랄의 <니코폴>이 번역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게다가 얼마전 부천센터에서 프랑스 만화에 관한 전시를 열어서인지, 프랑스만화에 대한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드디어 이 백수건달에게도 할 일이 무궁무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뭐랄까, 괜한 묘한 걱정꺼리가 슬그머니 발을 내민다. 이런걸 걱정을 사서한다고 하지 아마. 왜 나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근데, 복지부동이란 말이 배깔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남?)
어떤 분이 한국사람을 정의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의리와 신의로 뭉쳐진이라고 표현을 했던가? 어짜든동간에, 이놈의 의리와 신의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실지로 사감과 공적인 관계를 언제든지 혼동할 수 있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냄새 나는 어떤 것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다. 불행히도. 프랑스 사람은 어떨까? 사실 뭐 내가 <이웃나라 먼나라>같은 걸 쓸 정도로 프랑스나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 빠삭하진 전혀 않지만, 내가 경험한 하에서 이들은 우리식으로 보면 참 외로운 사람들이다. 어릴 때부터 결코 부모와 같이 자지 않는다. 18세가 되면 독립하고, 그뒤부턴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직장을 가지던지, 동거를 하건 결혼을 하건, 부모와는 모든 관계에서 해방된다.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학교에서 보면 도대체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 건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중산계층의 이야기이다. 아이와 부모는 항상 대화를 한다. 명령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키려면 합당한 설명을 해준다. 비록 그것이 간난아기라도 말이다.
학교수업을 들으면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선 누가 어떤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론가에 대해 빠삭하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은 감탄하지만, 여기선 바로 되받는다. "아,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했지, 근데 그건 그렇고, 네 생각은 뭔데?" 예수고 부처고 부모고 들뢰즈고 누구건 간에 자기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는 무시한다. 즉, 정보는 어디에나 흘러넘친다는 것이다. 지성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상을 자신의 논리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콩심으면 콩나고 팥심으면 팥나는 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모든 창작자들은 자신의 논리가 명확하다. 심할 정도로. 논리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교육의 결과이니까.
저녁 8시가 되면 거리가 썰렁하다. 웬만한 번화가를 제외하고 주택가로 들어서면 불켜진 상점이라곤 아랍사람들이 하는 조그만 가게들뿐이다. 자, 그럼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다 뭘 할까나? 하하! 만화책을 보는 것이다! 농담이고, 무엇이라도 한다. 즉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이틀에 사흘이 멀다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술먹거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자신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말이면 집에 있는 화분을 가꾸거나 자신의 일을 한다. 이사를 하면 전구와 전등갓까지 다 떼어간다. 원래 집에 달려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콘센트 정도? 자기에게 맞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장치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므로 시간날 때마다 집도 고치고 벽지도 바르고 여유있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들은 처음에 프랑스에 오면 거의 미쳐버리려고 한다. 뭐 하나 되어 있는게 없으니, 게다가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는 모든 일은 너무나 고용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라도 책장을 사다가 맞추고 끼우고 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전화한통으로 배달까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겐 고통이 그들에겐 생활의 즐거움이다. 우리와는 삶의 질의 토대 자체가 엄청 틀리다.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다면 프랑스의 만화와 우리나라의 만화란 과연 같은 것일까? 아니, 뭐 형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욕구를 해소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시스턴트 없이 혼자 일하고, 잡지의 마감에 시달리지도 않고(대부분 책으로 바로 출판하니까)...뭐 어쨋건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기껏해야 1년에 한 50페이지 짜리 책하나 내면 많이 작업한 것이다. 프랑스의 만화는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만화시장은 대부분 독자들이 사서 읽는다. 사서 읽는 것과 빌려서 보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자기가 보유한다는 것은 여러번 되풀이해서 읽고 본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러번 보아도 즐거울 그 무엇인가를 산출해놓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그림체도 우리와는 틀리고, 만화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즐기는가도 우리와도 확연히 들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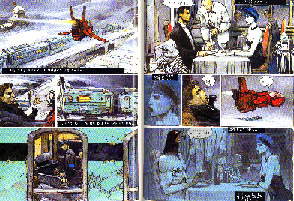
자, 이제 다시 번역출간된 프랑스 만화책들에 눈을 돌려보자. 앙키 빌랄은 훌륭한 작가이고 현재 프랑스에서도 아마 몇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다. 그는 만화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그래픽적 소설(유명한 소설가에 삽화를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에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그래피즘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산출하기 힘든 색채의 아름다움에 우선은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또한 뭐 읽을 만하다. 이것을 그대로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은 뭐 그렇게 신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유럽만화의 한 작품, 우리와는 토대가 엄청 틀린 곳에서 산출된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설사 그렇진 않겠지만, 섣부른 우리나라 만화와의 비교는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하나의 텍스트, 자료로써 즐기면 좋을 듯 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무척이나 궁금한데, 혹 읽으신 분이 있다면 시간날 때 어떤지 메일이라도 보내주면 이 궁금증이 좀 해결될려나? 아 그럼 이제 잼없는 잔소리는 그만. 다음번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본지에서는 필자의 원고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