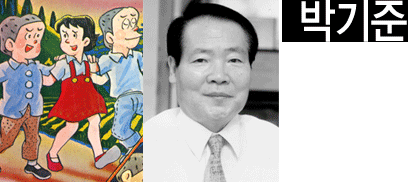
최근에는 다양한 작법서가 출시되고 있지만, 불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과거에는 만화가가 꿈일지라도 그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야만 했다. 더욱이 1960년대에는 ‘불량만화’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터라 만화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 ‘만화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 주위에 물어볼 때도 없고, 변변한 책 한권 없던 이 시절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책이 있었으니 <만화작법>이 그것이다. 이 한권의 책을 통해 박기준이 창작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후학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영주는 박기준을 가리켜 “밝고 건강한 꼴찌들을 사랑했던 작가”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박기준은 만화에서의 주인공이 우리 사회에서 잘나고 똑똑한 일등들이 아니라 오히려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꼴찌들의 모습을 소외되거나 낙오된 모습이 아니라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했던 것이다. 그에 대표적인 캐릭터는 ‘두통이.’ 1950, 6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시리즈’ 형태로까지 발전된 두통이는 이 시대 대표적인 우리 만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용사>, <파이팅 오징어> 등의 작품들을 통해 착실하고 무미건조한 캐릭터보다는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활기차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하여 만화를 보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했다.
작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그 결과물로 <만화작법>을 출간했던 것이 1964년. 만화이론서로서는 물론 창작서로서도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인 이 책은 만화를 처음 그리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유일무이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후 1972년, 1978년 차례로 재판되기도 했다. 이 같은 후학양성에 대한 관심은 직접 만화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문하생 시스템이 일반적이었던 1980년대, 그는 이미 제일만화학원을 개원함으로써 만화교육의 전문성을 보여준 바 있다.
또,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1970년대에는 무분별한 표절과 모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에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체를 모사해서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체를 억울하게 도둑맞는 사례”도 있었는데 “협회의 어느 회원이 윤승운의 캐릭터를 모작한 사례가 있어서 협회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 역시 만화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만화창작의 기틀을 조성하려는 그의 노력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최근까지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애니메이션 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인 실천으로 옮겨왔으며, 이 외에도 한국만화역사자료관 원고보존위원회, 일본 만화신문 편집자문 위원 등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며 전방위적인 만화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자료 : <계간만화>, <다시 보는 우리만화>, <한국만화통사>, <한국만화인명사전>